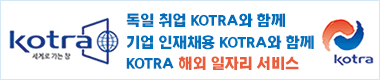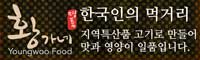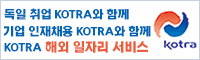사는얘기 봄에 만난 친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onioslu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5,292회 작성일 02-11-01 23:55본문
안녕하세요? 간간히 들어와 조회 수는 늘려 놓았어도, 이 곳에 글을 써보기는 처음이군요. 만남 하니까 유난히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끄적여 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 교육부가 돌린 뺑뺑이는 나와 나의 정든 동네 중학교 친구들을 갈라 놓았다. 보기 좋게 혼자서 멀찍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다. 가게와 상점, 골목길의 가로등, 이정표, 학교 운동장의 한 귀퉁이에 처 박힌 기다란 나무의자. 학교 근처의 모든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것에 그저 어색하기만 했는데, 하물며 이리 저리 활기를 치며 돌아다니는 반 아이들에 대한 낯선 기분은 오죽했겠는가. 그래도 사람이란 저마다 마음이 통하는 주머니를 하나씩 차고 있는지, 내게도 쉬는 시간 매점에서 군것질을 하고 점심시간이면 운동장 잔디를 함께 뛰며 밟을 친구가 생겼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2주 정도가 지나자, 성적 순으로 뽑힌 몇몇 이들이 차례로 교탁 앞으로 나와 자신에게 한 표 던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 중 유난히 눈에 띄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거슬리다’라는 표현을 써 봄 직도 할 만한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태양에 기분 좋게 그을린 듯한 피부를 지닌 그는 고지식하게 보이는 새까만 뿔 테 안경을 귀에 걸치고 있었는데, 관자놀이와 안경 다리의 아래 쪽에 살짝 돋은 머리카락 역시 숯처럼 검은 빛을 하고 있었다. 목덜미를 살 짝 덮은 흰 와이셔츠 컬러 아래의 채워지지 않는 두 개의 단추가 그의 전체적인 고지식한 느낌을 한 풀 꺾이도록 하는 듯 싶더니, 반듯하게 다려진 두툼한 감색 교복 상의가 그러한 순간의 착각을 단번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그 주에 나는 그냥 책이 좋다는 이유로 방송반에 함께 들자는 친한 친구의 조심스러운 부탁들 거절하고 도서부에 가입원서를 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지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구실로 도서부의 멤버가 되기 위해 필기고사에 면접까지 치루었던 것이다. 이로써 소박한 자부심을 안고 맞이했던 도서부 첫 모임에서 놀랍게도 그 녀석을 보게 되었고, 우리는 그제서야 인사를 나누며 통성명을 했다.
그 아이와 나는 정리부원이 되어, 한국표준분류법에 따라 도서를 정리하고, 대출과 반납을 처리했다. 또한 새로운 도서가 사서실의 문을 두드리면 사서선생님의 양 어깨 뒤에 나란히 서서, 도서 카드에 제목, 작가, 출판사, 출판년도, 분류번호 등을 직접 적는 것을 보고 있다가, 하나씩 나누어 받아 들고는, 책 맨 뒤의 종이 주머니에 꽂아두곤 했다.
그러면서 그와 나 사이에는 대화의 양이 점차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서로는 많은 부분에서 기분 좋은 일치를 맛보았다. 2주 마다 도서부원들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독특하고 기발한 가치관을 터트렸고, 그 과정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꼭지점에서 다시 만났다.
나아가서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의 슬픔 따위는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한 반에서 도시락을 같이 먹거나, 백일장에서 하나의 나무 밑 하나의 벤치 아래에서 글짓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만남을 이루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나는 함께 쉬는 시간의 10분 동안 농담을 주고 받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선생님을 심하게 내리치는 언어 폭력을 가하거나, 쪽지시험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 내기 위한 익살스러운 동반자가 되는 것처럼 겉으로의 친근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고 믿었다.
2학년이 되자, 우리는 한 반이 되지 못했지만, 서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 그의 집에 처음 놀러 갔던 시기도 2학년 봄이었다. 버스를 타고 여러 정거장을 지나야 집에 다다를 수 있었던 나와는 달리, 교문 앞 50미터 남짓한 골목길을 지나 횡단보도만 한번 건너주면 그는 얼마든지 복도식 아파트 13층, 엘리베이터에서 다섯 번째 그의 집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건조한 나뭇가지에 아직 파란 잎을 내리지 못한 그 차가운 어느 봄날, 나는 현관 오른쪽의 작고 어두운 그의 방안에서 사뭇 진지한 이야기와 당시 최고로 심각했던 고민들을 이리 저리 주절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10대를 한없이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옹졸한 마음 씀씀이를 낳게 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그와 같은 반도 되지 못했거니와 그다지 깊은 왕래가 없었다. 가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칸막이 도서실 안에서 저 편 창가에 높다랗게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하는 그를 보았을 뿐이다. 나는 3학년 1반, 그는 3학년 4반. 이 두 반은 하나의 복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좀처럼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2학년 때 갑작스레 친해진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남의 반에 얼씬 도 해보았지만, 그는 책 속을 파고들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를 주시하던 나를 보고 하루는 친구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공부만 하면 많은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 그러나 도대체 그 많은 지식을 어디에다 써 먹는담? 그 걸 다시 풀어놓아야 할게 아니냐. 저 녀석은 지금 맘껏 자신의 것들을 맘껏 터놓을 그런 친구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 아무도 없다고.”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말이다.
대학 입학. 그토록 기대했던 해방감과 자유라는 기쁨의 감정은 어쩌면 대학합격 통지를 받아서부터 입학식을 할 때까지가 아니었나 싶다. 나름의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온 것 같은데, 막상 대학의 문턱에 다다르니 그 곳은 텅 빈 운동장과도 같았다. 대학생으로서 한 달을 넘기고 있으니, 고등학교 후배랍시고 연락을 해왔다.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노는 날 우리 도서부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 작년에 합격기원 엿이랑 막걸리 한잔에 대한 보답은 해주셔야죠.”
얻어 먹은 것이 있으니 거절도 못하고 4월의 첫 휴일, 졸업 후 처음으로 모교를 찾았다. 정말 잊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교실 한 빌려서 17살 신입생들이 장기자랑 하는 것 구경하랴, 준비한 다과 먹으랴, 오랜만에 뵙는 사서선생님의 말씀 들으랴 정신 없는 터 여서 그와는 적절히 이야기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식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면서 그와 나는 나란히 길을 걷게 되었다.
“아직도 이 앞 아파트에 살고 있니?”
“그럼, 사는 곳은 그대로지.”
“자주 연락하고 살자. 집도 가까운데 학교 수업 마치고 간간히 근처에서 볼 수도 있겠다.”
“글세….”
글세…라고? 나는 말을 얼버무리는 그의 입 모양을 서운한 표정을 섞어 바라보았다. 한 동안 어색하게 대화가 끊겼다가, 그의 수줍은 말투로 다시 이어지기는 했는데…. 대화는 내 쪽에서 반응이 미지근해 다시 잘리고 말았다. 이유인 즉, 난 대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소위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한 것은 둘째 치고서,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도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이다. 학교 이름도 말하기 싫고, 전공도 언급하기 싫다고 했다. 현재 재수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대입에 도전을 하겠단다. 오늘도 정말 오고 싶지 않았으나, 모 후배와의 친분으로 억지로 오게 되었다는 것. 학교 앞 골목길을 지나, 횡단보도 앞에서 우리는 외마디 인사만으로 헤어졌다. 그 후 어떠한 연락도 오가지 않았다.
약 1년 반쯤 지난 후였던가. 대학생으로 맞이하는 두 번째 겨울에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한 인간이 그토록 절망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건너 들은 것이므로, 나는 단번에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음은 당연하다. 그 어느 순간에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이었으니까. 그러고 얼마 후, 우연히 그를 만났다. 그는 소매와 바지 단이 짧고, 품 또한 작아서 가슴이 꽉 끼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나 옷이 작아서 동생 것을 주워 입고 나온 것 같았다.
‘야, 너 이렇게 숨을 쉬다니! 내가 들은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구나.’
‘무슨 말이지?’
‘글세, 네가 자살을 했다는 거야.’
‘누가 그래?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였니?’
‘절대 아니지. 절대 그렇지가 않았지.’
‘주위 사람들 말 따위는 함부로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야.’
“야! 너 몇 시인 줄 알아? 네가 웬일로 아침 일찍부터 학원에 다닌다 했지!” 어머니의 노한 목소리. 이런, 꿈이었다. 다음날 그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고3 한 반 친구녀석으로부터 그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살았다던 그 복도식 아파트의 13층 난간에서 투신자살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아파트 아래 아스팔트에 아직도 경찰이 그려놓은 그의 몸뚱어리 윤곽이 빨간 페인트 자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가 죽던 날 오후, 장을 보러 가려는 그의 어머니를 향해, ‘엄마, 아주 나중에 뵈요. 오랫동안 못 볼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했다라는 것이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와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그에 대해 무엇을 모르고 있었기에, 일이 이 지경으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처음에 나는 그가 무엇에 대해 깊이 절망하고 좌절했는지 잘 몰랐었다고 생각했었다. 그가 시종일관 느꼈을 비참하고도 우울한 기분이 무언지 몰랐기 때문에 그를 위해 어떤 위로의 말도, 적당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애초에 그의 절망을 본 순간 다가서지도 못하지 않았는가. 겁을 내면서. 그저 함께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 봐.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은 ‘꿈’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 좋아하고 곁에 두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리하여 끌어 안고, 사랑하고 기대이고 싶은 것들. 이 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것이다. 인생의 비극이란, 가장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외면하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어찌 깨닫지 못했건 것일까.
그 후 한 달 뒤쯤에 다시 한번 그를 만났다. 이번에는 단번에 꿈임을 알 수 있었으나, 나는 거기서 깨어나지 않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너는 어리석었어.’
‘그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봐, 불행하게도 너와 나의 대화거리는 이제 그 뿐이야.’
‘아, 정말 그렇구나.’
‘넌 뭐가 되고 싶었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었냐고!’
나는 이렇게 물었었다. 그러나 답을 듣지는 못했다. 영영 답을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든다. 그 이후에 딱 한 번 더 꿈에서 그를 만났지만,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는 무엇으로 살고 싶었을까? 그것은 이루어내기에 정녕 불가능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의미로서 이 세상에 살아 남은 것일까….
고등학교에 입학. 교육부가 돌린 뺑뺑이는 나와 나의 정든 동네 중학교 친구들을 갈라 놓았다. 보기 좋게 혼자서 멀찍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다. 가게와 상점, 골목길의 가로등, 이정표, 학교 운동장의 한 귀퉁이에 처 박힌 기다란 나무의자. 학교 근처의 모든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것에 그저 어색하기만 했는데, 하물며 이리 저리 활기를 치며 돌아다니는 반 아이들에 대한 낯선 기분은 오죽했겠는가. 그래도 사람이란 저마다 마음이 통하는 주머니를 하나씩 차고 있는지, 내게도 쉬는 시간 매점에서 군것질을 하고 점심시간이면 운동장 잔디를 함께 뛰며 밟을 친구가 생겼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2주 정도가 지나자, 성적 순으로 뽑힌 몇몇 이들이 차례로 교탁 앞으로 나와 자신에게 한 표 던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 중 유난히 눈에 띄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거슬리다’라는 표현을 써 봄 직도 할 만한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태양에 기분 좋게 그을린 듯한 피부를 지닌 그는 고지식하게 보이는 새까만 뿔 테 안경을 귀에 걸치고 있었는데, 관자놀이와 안경 다리의 아래 쪽에 살짝 돋은 머리카락 역시 숯처럼 검은 빛을 하고 있었다. 목덜미를 살 짝 덮은 흰 와이셔츠 컬러 아래의 채워지지 않는 두 개의 단추가 그의 전체적인 고지식한 느낌을 한 풀 꺾이도록 하는 듯 싶더니, 반듯하게 다려진 두툼한 감색 교복 상의가 그러한 순간의 착각을 단번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그 주에 나는 그냥 책이 좋다는 이유로 방송반에 함께 들자는 친한 친구의 조심스러운 부탁들 거절하고 도서부에 가입원서를 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지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구실로 도서부의 멤버가 되기 위해 필기고사에 면접까지 치루었던 것이다. 이로써 소박한 자부심을 안고 맞이했던 도서부 첫 모임에서 놀랍게도 그 녀석을 보게 되었고, 우리는 그제서야 인사를 나누며 통성명을 했다.
그 아이와 나는 정리부원이 되어, 한국표준분류법에 따라 도서를 정리하고, 대출과 반납을 처리했다. 또한 새로운 도서가 사서실의 문을 두드리면 사서선생님의 양 어깨 뒤에 나란히 서서, 도서 카드에 제목, 작가, 출판사, 출판년도, 분류번호 등을 직접 적는 것을 보고 있다가, 하나씩 나누어 받아 들고는, 책 맨 뒤의 종이 주머니에 꽂아두곤 했다.
그러면서 그와 나 사이에는 대화의 양이 점차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서로는 많은 부분에서 기분 좋은 일치를 맛보았다. 2주 마다 도서부원들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독특하고 기발한 가치관을 터트렸고, 그 과정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꼭지점에서 다시 만났다.
나아가서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의 슬픔 따위는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한 반에서 도시락을 같이 먹거나, 백일장에서 하나의 나무 밑 하나의 벤치 아래에서 글짓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만남을 이루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나는 함께 쉬는 시간의 10분 동안 농담을 주고 받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선생님을 심하게 내리치는 언어 폭력을 가하거나, 쪽지시험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 내기 위한 익살스러운 동반자가 되는 것처럼 겉으로의 친근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고 믿었다.
2학년이 되자, 우리는 한 반이 되지 못했지만, 서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 그의 집에 처음 놀러 갔던 시기도 2학년 봄이었다. 버스를 타고 여러 정거장을 지나야 집에 다다를 수 있었던 나와는 달리, 교문 앞 50미터 남짓한 골목길을 지나 횡단보도만 한번 건너주면 그는 얼마든지 복도식 아파트 13층, 엘리베이터에서 다섯 번째 그의 집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건조한 나뭇가지에 아직 파란 잎을 내리지 못한 그 차가운 어느 봄날, 나는 현관 오른쪽의 작고 어두운 그의 방안에서 사뭇 진지한 이야기와 당시 최고로 심각했던 고민들을 이리 저리 주절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10대를 한없이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옹졸한 마음 씀씀이를 낳게 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그와 같은 반도 되지 못했거니와 그다지 깊은 왕래가 없었다. 가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칸막이 도서실 안에서 저 편 창가에 높다랗게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하는 그를 보았을 뿐이다. 나는 3학년 1반, 그는 3학년 4반. 이 두 반은 하나의 복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좀처럼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2학년 때 갑작스레 친해진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남의 반에 얼씬 도 해보았지만, 그는 책 속을 파고들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를 주시하던 나를 보고 하루는 친구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공부만 하면 많은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 그러나 도대체 그 많은 지식을 어디에다 써 먹는담? 그 걸 다시 풀어놓아야 할게 아니냐. 저 녀석은 지금 맘껏 자신의 것들을 맘껏 터놓을 그런 친구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 아무도 없다고.”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말이다.
대학 입학. 그토록 기대했던 해방감과 자유라는 기쁨의 감정은 어쩌면 대학합격 통지를 받아서부터 입학식을 할 때까지가 아니었나 싶다. 나름의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온 것 같은데, 막상 대학의 문턱에 다다르니 그 곳은 텅 빈 운동장과도 같았다. 대학생으로서 한 달을 넘기고 있으니, 고등학교 후배랍시고 연락을 해왔다.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노는 날 우리 도서부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 작년에 합격기원 엿이랑 막걸리 한잔에 대한 보답은 해주셔야죠.”
얻어 먹은 것이 있으니 거절도 못하고 4월의 첫 휴일, 졸업 후 처음으로 모교를 찾았다. 정말 잊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교실 한 빌려서 17살 신입생들이 장기자랑 하는 것 구경하랴, 준비한 다과 먹으랴, 오랜만에 뵙는 사서선생님의 말씀 들으랴 정신 없는 터 여서 그와는 적절히 이야기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식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면서 그와 나는 나란히 길을 걷게 되었다.
“아직도 이 앞 아파트에 살고 있니?”
“그럼, 사는 곳은 그대로지.”
“자주 연락하고 살자. 집도 가까운데 학교 수업 마치고 간간히 근처에서 볼 수도 있겠다.”
“글세….”
글세…라고? 나는 말을 얼버무리는 그의 입 모양을 서운한 표정을 섞어 바라보았다. 한 동안 어색하게 대화가 끊겼다가, 그의 수줍은 말투로 다시 이어지기는 했는데…. 대화는 내 쪽에서 반응이 미지근해 다시 잘리고 말았다. 이유인 즉, 난 대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소위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한 것은 둘째 치고서,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도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이다. 학교 이름도 말하기 싫고, 전공도 언급하기 싫다고 했다. 현재 재수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대입에 도전을 하겠단다. 오늘도 정말 오고 싶지 않았으나, 모 후배와의 친분으로 억지로 오게 되었다는 것. 학교 앞 골목길을 지나, 횡단보도 앞에서 우리는 외마디 인사만으로 헤어졌다. 그 후 어떠한 연락도 오가지 않았다.
약 1년 반쯤 지난 후였던가. 대학생으로 맞이하는 두 번째 겨울에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한 인간이 그토록 절망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건너 들은 것이므로, 나는 단번에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음은 당연하다. 그 어느 순간에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이었으니까. 그러고 얼마 후, 우연히 그를 만났다. 그는 소매와 바지 단이 짧고, 품 또한 작아서 가슴이 꽉 끼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나 옷이 작아서 동생 것을 주워 입고 나온 것 같았다.
‘야, 너 이렇게 숨을 쉬다니! 내가 들은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구나.’
‘무슨 말이지?’
‘글세, 네가 자살을 했다는 거야.’
‘누가 그래?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였니?’
‘절대 아니지. 절대 그렇지가 않았지.’
‘주위 사람들 말 따위는 함부로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야.’
“야! 너 몇 시인 줄 알아? 네가 웬일로 아침 일찍부터 학원에 다닌다 했지!” 어머니의 노한 목소리. 이런, 꿈이었다. 다음날 그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고3 한 반 친구녀석으로부터 그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살았다던 그 복도식 아파트의 13층 난간에서 투신자살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아파트 아래 아스팔트에 아직도 경찰이 그려놓은 그의 몸뚱어리 윤곽이 빨간 페인트 자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가 죽던 날 오후, 장을 보러 가려는 그의 어머니를 향해, ‘엄마, 아주 나중에 뵈요. 오랫동안 못 볼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했다라는 것이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와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그에 대해 무엇을 모르고 있었기에, 일이 이 지경으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처음에 나는 그가 무엇에 대해 깊이 절망하고 좌절했는지 잘 몰랐었다고 생각했었다. 그가 시종일관 느꼈을 비참하고도 우울한 기분이 무언지 몰랐기 때문에 그를 위해 어떤 위로의 말도, 적당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애초에 그의 절망을 본 순간 다가서지도 못하지 않았는가. 겁을 내면서. 그저 함께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 봐.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은 ‘꿈’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 좋아하고 곁에 두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리하여 끌어 안고, 사랑하고 기대이고 싶은 것들. 이 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것이다. 인생의 비극이란, 가장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외면하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어찌 깨닫지 못했건 것일까.
그 후 한 달 뒤쯤에 다시 한번 그를 만났다. 이번에는 단번에 꿈임을 알 수 있었으나, 나는 거기서 깨어나지 않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너는 어리석었어.’
‘그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봐, 불행하게도 너와 나의 대화거리는 이제 그 뿐이야.’
‘아, 정말 그렇구나.’
‘넌 뭐가 되고 싶었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었냐고!’
나는 이렇게 물었었다. 그러나 답을 듣지는 못했다. 영영 답을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든다. 그 이후에 딱 한 번 더 꿈에서 그를 만났지만,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는 무엇으로 살고 싶었을까? 그것은 이루어내기에 정녕 불가능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의미로서 이 세상에 살아 남은 것일까….
추천16
댓글목록
별이님의 댓글
별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겐 왠지 생경스러운 나라였는데, 바람님의 글을 읽으니 어느덧 마음은 스페인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하비 화이팅. ^^
날고 싶다님의 댓글
날고 싶다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진짜 넘넘 아름다운 글.. 오랜만에 카페(?) 들어와서 읽은 글이 제 마음까지 설레게 만드네요..
김영훈님의 댓글
김영훈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하하..너무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리 사무실 사람들 모두 전부 돌려 읽어보았답니다.
fairehm님의 댓글
fairehm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정확이 스페인의 J는 독어에서의 "CH"스펠중 발음기호가[x]로 끝나는 겁니다.nach나 doch같이 앞에a.o가 오는 단어들처럼요. [k]비슷한[h]죠. 참고로 독어의 ch는 앞에a.o오는것 만 발음만 이럽니다.
하카님의 댓글
하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정말로 오랫만에 베리에 왔더니...바람님의 아름다운 글이 있네요. 읽는 동안은 내내 웃을 수 있었는데 끝무렵이 되니 바람님의 아쉽고 섭섭한 감정이 느껴지는게 괜시리 코끝이 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