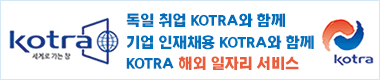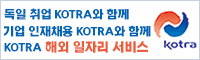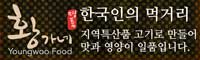사는얘기 아이들과 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을이름으로 검색 조회 4,870회 작성일 02-10-28 06:15본문
저녁에 세안하고 난 후에 얼굴에 소위 기초화장품이라는 걸 발라야합니다. 그렇지 않음 피부가 당기고 가렵기 까지 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 그거 악건성타입이라 그래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암튼 씻고 난 다음 수건을 새로 꺼내 잘 말린 새수건의 냄새를 맡으며 얼굴을 빠득빠득 닦고 난 다음 거울 앞에 앉습니다. 내겐 좀 괴로운 시간입니다. 전기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 모습을 눈돌리지 말고 바라봐야 하는 일은 거의 언제나 똑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침잠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30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대에는 빨리빨리 시간이 가서 빨리빨리 늙어서 빨리빨리 죽어버렸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20대에는, 지금의 나이가 되면 (인생으로부터서) 참 많은 걸 배웠을테고, 그러면 더 너그러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현명해질테고, 하여 두려운건 아무것도 없으리라 스스로에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설령100살까지 산다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내게서 기대하는 내 모습은 찾을 수 없을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거울을 볼때마다 느낍니다. 난 조금씩 조금씩 사위어 가고 있고, 얼굴에 잔주름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있고 생기는 조금씩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죽음에게로 더 많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기실 그런 표면적인 건 한 번 싸악 웃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만 난 내 늙어 가는 얼굴 뒤에 숨어 있는 내 정신을 봅니다. 나는 내가 별 해놓은 것도 없이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것이 영 마뜩찮습니다. 그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여전히 "유치원생" 이라고 날 부릅니다. 얼굴을 구기면 "으, 화났어? 난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린데..." 라고 발을 뺍니다.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얼굴이 가렵기 시작해 스킨과 로숀과 영양크림을 사사삭 해치우듯이 바릅니다.
거의 매일 되풀이 되는 작은 행사(?)에 어느 날 딸이 묻습니다.
"엄마, 왜 매일 화장해요?"
"이건 화장이 아니야. 화장은 분칠하고 입술 붉게 칠하고 눈썹도 그리고 눈주위에 색깔도 입히는거야. 엄마는 지금 '기초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왜 발라요? 예뻐질려고?"
"예뻐지는 건 바라지도 않아. 더 주름살 생기고 더 늙어 가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 보려고 하는 거야..."
딸은 마음이 참 곱습니다. 제 어미를 닮지 않은 탓입니다. 그 아이는 나를 위로한답시고 말합니다.
"엄마. 엄마는 지금도 참 예뻐요. 그리고 늙지도 않았어요.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흐흐흐, 고맙다만 이제 그런 말은 위로가 안된단다. "
".....아냐. 엄마보다 더 늙고 못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허벅지' 만 탱탱하고 얼굴만 탱탱하면 뭐해요? 이쌍하게(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상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딸은 좀 흥분해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 애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미안해집니다. 나는 아이에게 웃어 보이고 응, 그래. 고마워. 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서 거울 속의 내 모습에 등을 돌립니다. 딸아이는 새삼스럽게 다가와 내 허리를 꼬옥 껴안아주고,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던 7 살박이 아들도 괜히 다가와 함께 나와 제 누나를 안으며 말합니다.
"나도 세상에서 엄마가 젤 예뻐. 다른 엄마들은 하나도 안예뻐. 난 이 담에 엄마가 왕할머니(나의 할머니)처럼 늙으면 엄마를 업고 다닐거야. 내 색시가 싫어하면 색시를 당장 쫓아 버릴거야."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진심이라는 걸 압니다. 나는 내가 우습기도 하고 아이들이 우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것에 기뻐한다는 게 어이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엄마를 위로하려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서 크게 웃으며 아이들을 마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투덜거리면 내 속의 착한 나는 말합니다.
"무슨 걱정이냐. 너의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네가 여태 사랑할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냐(물론 좀 구식이고 퉁명스럽기는 하지만). 게다가 아이들은 착하고 건강하지 않느냐. 너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고 불평하고 네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상심하지만 넌 이미 조금씩 해가고 있지 않느냐? 너의 아이들에게 지금 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존재 자체' 지 않냐? 게다가 이 세상에 예수가 아닌 다음에야 30에 인생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혹 여전히 넌 네 자신에 대해 겸손을 위장한 자기애에 사로잡힌 건 아니냐? 넌 행복의 축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걸 부정하면 넌 불행의 축에 끼게 되고 긍정하면 행복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걸 모른단 말이냐?...."
아들은 그를 기다리며 TV보는 나를 문 빼꼼히 열고 살피더니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한 모양, 머뭇거리며 다가와 묻습니다.
"엄마, 아빠 기다리시느라 힘드시지요? 제가 노래하나 불러드릴게요. 유치원에서 배운 건데요. 영어말, 중국말, 한국말, 일본말이 다 들어 있어요. 독일말은 근데 없어요. 뭐냐면요...(서론이 길기도 하지..) '나는 행복하다' 라는 노랜데요. 음... 지금은 잘 생각이 안나요.... 음, 뭐였더라.... 아,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아임 쏘 해피, 아임 쏘 해피....(그리고 또 일어와 중국어로 뭐라고 뭐라고 혀 짧은 소리로).."
"음, 그래 알았어, 엄마도 '정말 행복해'야"
"엄마, 사랑해요."
"음, 그래 알어. 엄마도 너 사랑해."
브레히트의 시에, 예전에는 두려울게 없었지만 지금은 내리는 빗방울 하나도 무섭다고. 왜냐면 그 방울에 내가 깨져부서질까봐...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래 전이라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두려움을 이제는 잘 이해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 달라진게 뭐냐고 묻는 다면 나는 "목숨의 이유가 변했습니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나는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언제든 어디로든 심지어 죽음에게로까지 내가 맘만 먹으면 떠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공허했었는지를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전적으로 충일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서적인 궁핍함은 예전보다 덜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속박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아이들때문이라도 더 건강해야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하고 더 많이 행복해야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은혜를 베풀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은혜 또한 많습니다. 가슴이 뻐근하도록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 비록 그들이 훗날 날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지금의 이 행복과 충만감과 사랑을 즐길것입니다.....
자유로니
2002-10-21 09:37:38
한 무신론자의 단상 혹은 푸념...
죽음이 슬픈건 그것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생물학적 소멸로서의 죽음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지만, 언젠가 누구나 예외없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야하고 또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목숨이 붙어 사는 모든 존재들의 그 위로할 바없는 숙명적인 비극성에 가슴이 아립니다. 생명있는, 몸받아 태어난 자들의 숙명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장대못을 박게 되는 그런 잔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시간동안 우리 36.5도의 연약한 영혼들끼리 서로를 의지하여 한번더 사랑하고 한번더 그 유한한 온기를 부비고 나눕시다. 주변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한번 더 사랑하고 베풉시다.
가을
2002-10-21 18:28:48
자유로니님도 '가을' 을 맞이 하셨군요. (아님 예전부터 가을 이셨나^^) 저 밑에서도 한 낯선 할머님의 죽음으로 말씀을 잊으시더니.
'죽음' 에 대해서 말인데, 저는 유신론자인데도 가짜신자라서 그런지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걸 믿을 수만 있다면 죽음이 좀덜 두려울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안믿기는 걸 어쩌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저는 아이들이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할때까지는(시집장가갈때까지) 기어이 이 곳에 살아 있고 싶습니다. 앞에 이미 이야기 했듯이, 전 그러지 못할까봐 아이들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Gloomy Sunday"같은 노래를 들어도 조금도 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자유로니님의 철학적 댓글에 너무 땅냄새나는 댓글을 쓰고 있군요.
가혹한 진실 하나--
아이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의 노처녀선생님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래 그 선생님 예쁘니? 삼촌 소개시켜주게, 라고 하자 아들이 아니 안예뻐,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당연히 엄마보다야 안예쁘겠지만 그래도...라고 장난기를 담지 않고 내가 말했더니 딸이 갑자기 으윽--- 하고 고개를 꺾었습니다. 야, 넌 엄마가 세상에서 젤 예쁘다 해놓구선 뭐야, 네 반응은? 거짓말이었어? 그러자 딸은 엄마는 참, 내가 예쁘다고 하는거하고 스스로 예쁘다고 하는 거하고 같아요? 엄마는 지금 잘난체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저는 조금도 예쁘지 않습니다.
나는 30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대에는 빨리빨리 시간이 가서 빨리빨리 늙어서 빨리빨리 죽어버렸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20대에는, 지금의 나이가 되면 (인생으로부터서) 참 많은 걸 배웠을테고, 그러면 더 너그러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현명해질테고, 하여 두려운건 아무것도 없으리라 스스로에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설령100살까지 산다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내게서 기대하는 내 모습은 찾을 수 없을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거울을 볼때마다 느낍니다. 난 조금씩 조금씩 사위어 가고 있고, 얼굴에 잔주름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있고 생기는 조금씩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죽음에게로 더 많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기실 그런 표면적인 건 한 번 싸악 웃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만 난 내 늙어 가는 얼굴 뒤에 숨어 있는 내 정신을 봅니다. 나는 내가 별 해놓은 것도 없이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것이 영 마뜩찮습니다. 그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여전히 "유치원생" 이라고 날 부릅니다. 얼굴을 구기면 "으, 화났어? 난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린데..." 라고 발을 뺍니다.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얼굴이 가렵기 시작해 스킨과 로숀과 영양크림을 사사삭 해치우듯이 바릅니다.
거의 매일 되풀이 되는 작은 행사(?)에 어느 날 딸이 묻습니다.
"엄마, 왜 매일 화장해요?"
"이건 화장이 아니야. 화장은 분칠하고 입술 붉게 칠하고 눈썹도 그리고 눈주위에 색깔도 입히는거야. 엄마는 지금 '기초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왜 발라요? 예뻐질려고?"
"예뻐지는 건 바라지도 않아. 더 주름살 생기고 더 늙어 가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 보려고 하는 거야..."
딸은 마음이 참 곱습니다. 제 어미를 닮지 않은 탓입니다. 그 아이는 나를 위로한답시고 말합니다.
"엄마. 엄마는 지금도 참 예뻐요. 그리고 늙지도 않았어요.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흐흐흐, 고맙다만 이제 그런 말은 위로가 안된단다. "
".....아냐. 엄마보다 더 늙고 못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허벅지' 만 탱탱하고 얼굴만 탱탱하면 뭐해요? 이쌍하게(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상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딸은 좀 흥분해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 애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미안해집니다. 나는 아이에게 웃어 보이고 응, 그래. 고마워. 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서 거울 속의 내 모습에 등을 돌립니다. 딸아이는 새삼스럽게 다가와 내 허리를 꼬옥 껴안아주고,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던 7 살박이 아들도 괜히 다가와 함께 나와 제 누나를 안으며 말합니다.
"나도 세상에서 엄마가 젤 예뻐. 다른 엄마들은 하나도 안예뻐. 난 이 담에 엄마가 왕할머니(나의 할머니)처럼 늙으면 엄마를 업고 다닐거야. 내 색시가 싫어하면 색시를 당장 쫓아 버릴거야."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진심이라는 걸 압니다. 나는 내가 우습기도 하고 아이들이 우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것에 기뻐한다는 게 어이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엄마를 위로하려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서 크게 웃으며 아이들을 마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투덜거리면 내 속의 착한 나는 말합니다.
"무슨 걱정이냐. 너의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네가 여태 사랑할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냐(물론 좀 구식이고 퉁명스럽기는 하지만). 게다가 아이들은 착하고 건강하지 않느냐. 너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고 불평하고 네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상심하지만 넌 이미 조금씩 해가고 있지 않느냐? 너의 아이들에게 지금 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존재 자체' 지 않냐? 게다가 이 세상에 예수가 아닌 다음에야 30에 인생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혹 여전히 넌 네 자신에 대해 겸손을 위장한 자기애에 사로잡힌 건 아니냐? 넌 행복의 축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걸 부정하면 넌 불행의 축에 끼게 되고 긍정하면 행복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걸 모른단 말이냐?...."
아들은 그를 기다리며 TV보는 나를 문 빼꼼히 열고 살피더니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한 모양, 머뭇거리며 다가와 묻습니다.
"엄마, 아빠 기다리시느라 힘드시지요? 제가 노래하나 불러드릴게요. 유치원에서 배운 건데요. 영어말, 중국말, 한국말, 일본말이 다 들어 있어요. 독일말은 근데 없어요. 뭐냐면요...(서론이 길기도 하지..) '나는 행복하다' 라는 노랜데요. 음... 지금은 잘 생각이 안나요.... 음, 뭐였더라.... 아,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아임 쏘 해피, 아임 쏘 해피....(그리고 또 일어와 중국어로 뭐라고 뭐라고 혀 짧은 소리로).."
"음, 그래 알았어, 엄마도 '정말 행복해'야"
"엄마, 사랑해요."
"음, 그래 알어. 엄마도 너 사랑해."
브레히트의 시에, 예전에는 두려울게 없었지만 지금은 내리는 빗방울 하나도 무섭다고. 왜냐면 그 방울에 내가 깨져부서질까봐...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래 전이라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두려움을 이제는 잘 이해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 달라진게 뭐냐고 묻는 다면 나는 "목숨의 이유가 변했습니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나는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언제든 어디로든 심지어 죽음에게로까지 내가 맘만 먹으면 떠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공허했었는지를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전적으로 충일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서적인 궁핍함은 예전보다 덜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속박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아이들때문이라도 더 건강해야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하고 더 많이 행복해야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은혜를 베풀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은혜 또한 많습니다. 가슴이 뻐근하도록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 비록 그들이 훗날 날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지금의 이 행복과 충만감과 사랑을 즐길것입니다.....
자유로니
2002-10-21 09:37:38
한 무신론자의 단상 혹은 푸념...
죽음이 슬픈건 그것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생물학적 소멸로서의 죽음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지만, 언젠가 누구나 예외없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야하고 또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목숨이 붙어 사는 모든 존재들의 그 위로할 바없는 숙명적인 비극성에 가슴이 아립니다. 생명있는, 몸받아 태어난 자들의 숙명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장대못을 박게 되는 그런 잔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시간동안 우리 36.5도의 연약한 영혼들끼리 서로를 의지하여 한번더 사랑하고 한번더 그 유한한 온기를 부비고 나눕시다. 주변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한번 더 사랑하고 베풉시다.
가을
2002-10-21 18:28:48
자유로니님도 '가을' 을 맞이 하셨군요. (아님 예전부터 가을 이셨나^^) 저 밑에서도 한 낯선 할머님의 죽음으로 말씀을 잊으시더니.
'죽음' 에 대해서 말인데, 저는 유신론자인데도 가짜신자라서 그런지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걸 믿을 수만 있다면 죽음이 좀덜 두려울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안믿기는 걸 어쩌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저는 아이들이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할때까지는(시집장가갈때까지) 기어이 이 곳에 살아 있고 싶습니다. 앞에 이미 이야기 했듯이, 전 그러지 못할까봐 아이들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Gloomy Sunday"같은 노래를 들어도 조금도 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자유로니님의 철학적 댓글에 너무 땅냄새나는 댓글을 쓰고 있군요.
가혹한 진실 하나--
아이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의 노처녀선생님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래 그 선생님 예쁘니? 삼촌 소개시켜주게, 라고 하자 아들이 아니 안예뻐,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당연히 엄마보다야 안예쁘겠지만 그래도...라고 장난기를 담지 않고 내가 말했더니 딸이 갑자기 으윽--- 하고 고개를 꺾었습니다. 야, 넌 엄마가 세상에서 젤 예쁘다 해놓구선 뭐야, 네 반응은? 거짓말이었어? 그러자 딸은 엄마는 참, 내가 예쁘다고 하는거하고 스스로 예쁘다고 하는 거하고 같아요? 엄마는 지금 잘난체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저는 조금도 예쁘지 않습니다.
추천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