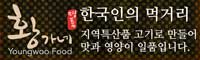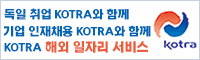3월22일 월. 눈과 비 내림
페이지 정보
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2 12:13 조회2,745관련링크
본문
이곳에 글을 남기는 게 더 이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 워낙 많아야 말이죠. 한국 들어와 여친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군요.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꺼야. 외려 반발심만 생기고 말지." 그 이후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야 말이죠...-_-;;
그러고 이곳을 슬쩍 들여다 보니,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만 드네요. 뭐 좀 안다 싶을 때 어찌나 깝죽댔던지, 제가 말이죠. 지금 보니 아는 거라곤 쥐뿔도 없는데..(써놓고 보니 왜 또 하필임 쥐야=_=)
오늘 서울은 오후에 싸리눈과 눈과 비가 주고니 받고니 하며 내립니다.
독일에서 썼던 글 수정하고 정리하다, 하나 남겨요. 이 얘기도 예전에 유학일기란에 올렸던 것 같은데....
에이미
일기예보에선 한 달 동안 해가 몇 시간이나 구름에서 벗어났었는지를 알려주기도 하는 곳, 독일. 켜켜이 쌓여진 기억의 서랍을 열어보면 늘 잿빛 하늘 아래 무채색 풍경이다. 하지만. 마치 음습한 늪지에 유채화 한 송이 피어 오른 마냥, 그 무표정한 추억의 한 켠을 화사한 총천연색으로 물들여준 아이.
“Hallo, Wie heisst du?(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길가는 낯선 어른에게 아이가 반말로 말을 걸어온다. 68혁명을 거치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구호를 일상에 뿌리내리기 위해 독일어에 엄연히 존재하는 존칭(siezen)을 거부하는 문화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어린 아이가 먼저 다가와 반말로 말을 걸어주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다.
“에이미? 그거 독일 이름이야?”
“아니, 아빠가 좋아하는 영화 속 아이의 이름이 에이미야. 아빠는 내 이름을 에이미라고 해줬어”
그 영화를 봤다. 감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음악가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움을 품은 아이가 주인공이었던. 자폐증에 걸린 아이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준 것은 하릴 없이 거리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던 청년. 거리에서 만난 이름 ‘에이미’에게선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읽을 수 있었고,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던 나는 그 우연에 즐거워하며 에이미의 세상 안으로 발을 디딘다.
“이게 내 이름이야, 이제 네 이름을 써봐.”
거리에서 친구들과 분필로 그림을 그리며 놀던 에이미는 자신의 이름을 아스팔트 위에 적었고, 그렇게 그 옆으로 나의 이름이 쓰였다. 생소한 동양인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기위해 또박 또박 연습하는 에이미. 수줍은 듯 양손을 가지런히 빼들고 서있던 남자 아이가 자신의 4살 박이 동생이라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성이는 또래아이는 옆집친구라고, 알록달록 그림으로 치장된 창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기 방이라고 한다. 밤이 되면 그곳에서 잠을 잔다며 행여 내가 다른 창문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조급해 한다. 여섯 손가락 빼꼼히 뽑아들곤 “나는 여섯 살이야”한다. 까맣게 비어있는 앞니를 자랑스레 내보이며 며칠 전 있었던 이빨사건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그 날은 해가 화창하였던가? 음영 없이 하늘을 빼곡히 매운 잿빛 구름 아래, 마치 어깨위에 가랑비 쌓이듯 해의 기운이 산산이 부서져 내려앉는 회색 풍경이었던가? 기억할 수없는 것은 기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거리에서 마주칠 때면 큰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와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늘어놓는 에이미. 아이의 음성으로 거침없이 흩날리는 낱말들은 거리의 무심한 풍경에 수놓아지는 무지갯빛 동심의 향연이었다.
뛰어 들어가 폭 파묻히면 무중력 동화 속으로 빠져들 것만 같은 옥수수 밭. 푸더더덕 그 노란 들판의 모서리를 치고 올라 훤칠한 나무 품안으로 파고들어 숨바꼭질하는 까마귀 한 쌍. 괴괴하다 싶을 정도로 차분한 울림, 온몸으로 전해지는 육중한 대지의 울림으로 아침잠을 깨운 양떼의 발걸음. 옥수수 밭과 낡은 4층 아파트 사이의 좁은 도로를 끝이 보이지 않는 양떼의 행렬이 점령했던 그날이 봄이었던가, 가을이었던가? 한가로웠던 일요일 아침의 기억을 모아본다. 장판 밑에 숨어 삐걱이는 마룻바닥. 대문인냥 방안을 향해 한 아름 밀려 젖혀지는 커다란 창문. 느리디 느린 양떼의 끝머리에서 부산히 서성이는 개 두 마리. 열린 창밖으로 내민 내 머리를 휘감는 뽀송한 아침 공기. 햇살 가득한 풍경에 몽실 몽실 수놓아진 하얀 양털. 기억의 파편을 한데 모아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니 봄 향기가 몰려온다.
독일에서의 두 번째 도시 도르트문트, 나는 그렇게 시골냄새가 폴폴 풍기는 외각에 거처를 정했다. 한국인의 풍문도, 학교동료의 발길도 닿을 일 없는 한적한 곳으로. 사람에겐 누구나 한 번 쯤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곳, 나의 신체에 묻어있는 모든 시간과 기억이 부재하는 곳. 하지만 그와 같은 공간에 몸을 파묻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모든 건 망각되지 않는 내 머릿속의 잔재, 그 기억이란 것에서부터 새어나오는 것이니. 좋아하지 않는 노래일수록 한 번 들으면 귀에 못 박혀 하루 종일 떨쳐지지 않는 것처럼, 잊고 싶은 기억일수록 사물의 측면에 사건의 잔상을 담아 일상의 구석구석에 포진하여 나를 급습한다. 과거의 나를 잊기 위해선 현재의 나를 반성하고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던 당시, 그렇게 나는 한적한 동네 낡은 아파트 방구석에 자신을 감금하곤 존재의 묵은 때를 벗겨내겠노라 하였다, 몇 년 동안. 20일이 넘도록 말 한마디 내뱉지 않은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길 위에 숨져있는 새 옆에 모로 누워 눈 마주치고 대화를 하기도 하며.
에이미는 나를 처음 만난 날 아스팔트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나의 손에 분필을 쥐어주었다. 가늘고 긴, 하지만 결코 상처 나지 않을 것만 같은 팔 다리. 파란 눈. 금발머리. 활짝 웃을 때 빠진 앞니가 드러나 보이는 에이미는 골목에서 마주칠 때 마다 나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었다. 어른인 나를 어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말을 잘못하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선입견을 보이지도 않았던. 명랑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 세워놓곤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을 들려주었던. 넘어져서 다친 사건을 이야기해주며 하지만 이젠 아프지 않다며 총총 뛰어가던. 장 보러 나갈 때마다 에이미와의 만남을 기대하던 나는 어쩌면 독일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을 게다. 그 아이가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지,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다면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게 될지······, 그런 것은 상관없다. 마치 무겁고 컴컴한 고전주의 정물화를 점묘파의 밝고 화사한 채색으로 변신시킨 마술 마냥 내 황폐했던 가슴에 동심의 무지개를 띄워준 아이. 그렇게 많은 타인들에게 따듯함을 전해주는 천사이기를 바랄 뿐이다. 보고픈 에이미. 에이미 옆에서 나는 그녀 또래의 수줍음 많은 소년이었다. 에이미의 친구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