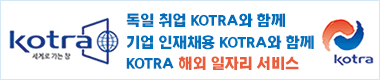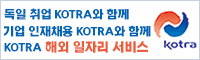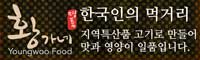이정의칼럼 검정밥(4)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독50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947회 작성일 13-03-28 11:21본문
똥일
1965년 1월 3일.
천길 땅속에서 힘들고 위험한 노동생활이 시작되는 첫 날.
천길 땅속에서 힘들고 위험한 노동생활이 시작되는 첫 날.
호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리 저리 뒹굴다가 새벽 네 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은 후 빵을 싼 종이꾸러미를 챙기고 회사로 갔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우리는 스타이거 사무실 제 칠 항 창구 앞에 모였다.
제 7항에는 이십 명이 배정되었는데 여섯 시 십오 분 전에 한 독일인이 와서 우리의 인원수를 점검하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우리는 그를 따라서 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전등의 축전지를 허리에 맨 후 여기에 달린 주먹만한 전등을 안전 헬멧에 꽂고 또 탄산가스 필터를 허리에 찼다.
이 필터는 유일한 구명기구로서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어서, 지하에 불이나 메탄가스의 폭발이 날 때 필터를 끄집어내어 입에 물고, 코마개로 코를 막고, 입으로만 숨을 쉬면 들이마시는 공기에서 탄산가스를 걸러내는 가스 여과기였다. 이 여과기는 90분간 효력을 발생하며 이것을 사용할 경우 뛰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지상교육시에 배웠다.
전등 축전지, 필터, 수통을 옆구리에 차고 무릎에는 꿇어앉아서 일할 때 무릎에 끼우는 무릎마개를 차고 정강이에는 정강이 보호장치를 부쳤다. 독일인은 또 한번 우리의 지하근무 복장이 다 차려졌는지 낱낱이 훑어보고는 우리를 데리고 승강기가 있는 수갱으로 갔다.
나는 겉보기에 늠름한 광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승강기가 있는 수갱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었다. 승강기 앞에는 아침반 광부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여섯 시 정각에 땡땡땡 하는 신호소리가 울리더니 승강기의 철문이 열렸다. 나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승강기에 올라탔다. 우리를 태운 승강기는 천길 땅속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기압이 바뀌니 귀가 막혀서 멍멍해졌다. 독일 사람이 우리더러 어금니를 물고 침을 삼키라고 했다. 그렇게 하니 귀가 다시 티였다.
삽시간에 우리는 땅속 1000미터 깊은 곳에 도착했다. 승강기에서 내려서 주위를 휘둘러보니 전깃불이 밝게 비취는 수갱 근처의 굴은 넓고 크며, 석탄을 실은 소형 기차들이 몇 줄씩 서 있어 마치 기차 정거장 같았다. 지하 같은 느낌이 없었다. 우리는 독일인을 따라 대기하고 있는 소형 기차에 탔다.
여섯 시 십오 분에 우리를 태운 기차는 덜커덕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거장을 벗어나니 굴이 좁아지고 사방이 캄캄했다. 천길 땅속에서 기차를 타고 간다는 이상야릇한 기분도 들었지만 또 내 머리 위에 천 미터나 되는 무겁고 두꺼운 암반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움과 압박감이 더 심해졌다.
‘무슨 죽을 기(氣)가 들어서 내가 독일의 천길 땅속으로 자원해서 왔던가? 한국에는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나? 죽으나 사나 내 하늘 아래, 내 조국, 내 땅에서 살지, 무슨 출세라고 이역만리 머나먼 이곳까지 와서 땅속에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내 운명이 엎질러진 물통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덜커덕 기차가 섰다. 시계를 보니 약 반시간 걸렸다. 독일인이 우리더러 내리라고 했다. 차에서 내려 사방을 둘러보니 굴이 좁아서 굴의 면적이 서너 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전등 축전지, 필터, 수통을 옆구리에 차고 무릎에는 꿇어앉아서 일할 때 무릎에 끼우는 무릎마개를 차고 정강이에는 정강이 보호장치를 부쳤다. 독일인은 또 한번 우리의 지하근무 복장이 다 차려졌는지 낱낱이 훑어보고는 우리를 데리고 승강기가 있는 수갱으로 갔다.
나는 겉보기에 늠름한 광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승강기가 있는 수갱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었다. 승강기 앞에는 아침반 광부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여섯 시 정각에 땡땡땡 하는 신호소리가 울리더니 승강기의 철문이 열렸다. 나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승강기에 올라탔다. 우리를 태운 승강기는 천길 땅속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기압이 바뀌니 귀가 막혀서 멍멍해졌다. 독일 사람이 우리더러 어금니를 물고 침을 삼키라고 했다. 그렇게 하니 귀가 다시 티였다.
삽시간에 우리는 땅속 1000미터 깊은 곳에 도착했다. 승강기에서 내려서 주위를 휘둘러보니 전깃불이 밝게 비취는 수갱 근처의 굴은 넓고 크며, 석탄을 실은 소형 기차들이 몇 줄씩 서 있어 마치 기차 정거장 같았다. 지하 같은 느낌이 없었다. 우리는 독일인을 따라 대기하고 있는 소형 기차에 탔다.
여섯 시 십오 분에 우리를 태운 기차는 덜커덕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거장을 벗어나니 굴이 좁아지고 사방이 캄캄했다. 천길 땅속에서 기차를 타고 간다는 이상야릇한 기분도 들었지만 또 내 머리 위에 천 미터나 되는 무겁고 두꺼운 암반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움과 압박감이 더 심해졌다.
‘무슨 죽을 기(氣)가 들어서 내가 독일의 천길 땅속으로 자원해서 왔던가? 한국에는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나? 죽으나 사나 내 하늘 아래, 내 조국, 내 땅에서 살지, 무슨 출세라고 이역만리 머나먼 이곳까지 와서 땅속에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내 운명이 엎질러진 물통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덜커덕 기차가 섰다. 시계를 보니 약 반시간 걸렸다. 독일인이 우리더러 내리라고 했다. 차에서 내려 사방을 둘러보니 굴이 좁아서 굴의 면적이 서너 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독일인은 우리의 인원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는 자기 이름은 ‘에밀’이라고 하면서 우리더러 <마이스터>라고 부르라고 했다. 우리와 함께 온 통역이 ‘마이스터’라는 말은 무엇의 전문가로서 스승, 우두머리, 윗사람 등의 뜻을 가지는데 광산에는 작업현장을 책임 맡은 선임노동자를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마이스터는 앞서 가고 우리는 그를 따랐다. 조금 가니 왼쪽으로 갈라지는 갱도가 나왔다. 우리는 그리로 들어섰다. 또 한참 가니까 갱도가 경사지기 시작했다. 비탈길을 한 오백 미터 내려가니 석탄을 실은 벨트 컨베이어가 달리고 있는 막장의 갱도가 나왔다.
공기가 흐리고 축축하고 더워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마이스터는 우리가 내려오던 공기가 아직 맑은 갱도에서 거기 놓여 있는 철 궤짝 위에 우리를 앉으라고 했다. 갱도의 벽에 기대앉으니 아침을 먹으라고 했다.
네 시 반에 아침을 먹고 왔는데 또 아침을 먹으라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통역이 아침을 집에서 먹지 않고 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는 것이 습관이니 가지고 온 빵을 하나는 지금 먹고 하나는 나중에 아홉 시 반경에 먹으라고 했다.
마이스터 에밀은 빵을 먹으면서 가지고 온 신문을 읽었다. 그는 한 반시간 후에 다 읽은 신문지와 빵을 쌌던 종이를 똘똘 뭉쳐서 아무렇게나 휙 던지고는 일어나서 우리가 앉아 있는 궤짝에 채여 있는 자물쇠를 열었다. 그 쇠로 만든 궤짝은 공구함(工具函)으로 거기에 우리가 쓸 연장이 들어 있었다. 우리를 두 명씩 나누어서 한 조(組)로 만들고, 조마다 곡괭이와 삽과 압축공기로 발동하는 굴착기인 <압바우 함머>와 공기에 연결하는 20m 긴 고무호스를 하나씩 주었다.
우리가 할 일은 갱도의 바닥을 파서 갱도의 면적을 넓히는 작업이었다. 독일의 석탄층은 카아본기(紀)에 4-5m까지 두꺼운 여러 개의 층으로서 지하에 평평하게 혹은 경사져서 깔려 있다. 채탄할 수 있는 탄층의 두께는 최소한 약 1m 되어야 했다. 한 막장을 설치할 때는 먼저 한 석탄층을 약 250m 길이의 간격으로 잘라서 양쪽 끝에 갱도를 시설하고 그 갱도 사이에 석탄층을 파내고 두 갱도를 연결한다. 이때 두 갱도 사이의 파낸 석탄층에 생기는 공간을 막장이라고 부른다. 막장은 쇠로 된 지주로 받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데 막장의 넓이는 6m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6m x 250m 면적이 하루에 3~4m 전진하는데, 이렇게 막장이 전진함에 따라 막장을 따르는 갱도가 길어진다. 막장이 끝날 때면 갱도의 길이는 거의 1000m에 달한다.
막장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정적으로 잠재하던 지압(地壓)이 동적인 압력이 되어 갱도주위를 누르기 시작한다. 갱도의 옆과 위는 철로 된 지주로 막혔지만, 바닥에는 막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갱도 바닥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통풍에도 지장이 있지만 인력과 자재(資材)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함으로 갱도를 넓혀야 한다. 그래서 갱도의 바닥을 파서 갱도를 높고 넓게 만들어야 하는 일이 우리가 오늘부터 할 일이었다.
10m 마다 한 조씩 배정하고 약 50cm 정도 깊게 파도록 했다. 바닥의 넓이는 약 4m 되었다. 나에겐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이 들었고 몸을 굽혀서 일을 하자니 허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일하는 도중에 괭이자루가 벽의 철주에 부딪치면 와그르르 하고 위에서 돌이 떨어지면서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켰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혼비백산해서 달아났다.
앉아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던 마이스터 에밀이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더러 돌아오라고 독촉하고 일을 시켰다. 에밀은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쉬거나 돌이 떨어져 달아날 때면 노상 입버릇처럼 “솨이쎄!” 라고 소리 질렀다. 통역은 “솨이쎄” 말은 똥이라는 뜻인데 상용적인 욕설로 독일에는 어느 경우든 화가 나면 “솨이쎄”라고 욕을 한다고 했다.
지하에서 처음 배운 말이 독일의 전문용 욕설인 솨이쎄였다. 솨이쎄가 똥이라는 뜻이지만, 그가 하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섞여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야! 이 똥 같은 한국 녀석들 왜 일은 않고 달아나느냐?”
“이 똥 새끼들 왜 일은 않고 또 쉬고 있느냐? 솨이쎄!”
나는 허리와 팔다리가 아픈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이놈의 나라까지 와서 욕들어먹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정말 노예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팔다리에 힘이 쑥 빠지고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쥐고 있던 압바우 함머를 놓아 버리고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함께 일하던 Z 형이 “너 왜 그래?” 하면서 걱정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 괜찮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저쪽 뒤에 앉아서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마이스터를 쳐다보았다. 채찍만 없다는 것 뿐이지, 뜨거운 햇살 아래서 목화송이를 따는 흑인 노예들을 몰아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우리가 달아나지 말라고, 우리 뒤에 앉아서 길목을 지키며 오렌지를 먹고 있는 그가 한없이 미웠다.
나는 Z 형에게 뒤로 조금 물러나라고 하고는 압바우 함머를 철주에 대고 눌렀다. 와르르 하고 돌이 몇 개 떨어지면서 먼지가 자욱하게 그가 앉아 있는 쪽으로 밀려갔다. 먼지 속에서 콜록콜록하는 기침소리와 함께 또 ‘솨이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독일인 중에서도 아주 하층에 속하는 독일 광부의 욕설을 들으며 일을 한다는 것도 원통했지만, 무덥고 먼지가 자욱한 탁한 공기를 마시며 허리를 굽히고 약 다섯 시간 일을 하고 나니, 아픈 허리도 참기 힘들었고 숨도 막히는 것만 같았다.
속으로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억누르며 독일 광산의 지하 첫날 일을 마쳤다. 우리를 태운 기차가 수갱으로 달리는 동안 덜커덕거리는 바퀴소리가 나에겐 ‘솨이쎄, 솨이쎄’ 하면서 귀속을 메아리치고 있었다.
회사 문을 나오니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눈이 내렸는지 집과 들은 한 뼘 정도 눈에 덮여 있었다. 눈길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오전에 땅속에서 하던 일을 생각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이런 천대를 받을 바에야 내 나라에 가서 내 나라 사람에게 욕을 듣고, 모욕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여기 땅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정신이면 한국에서 무슨 일을 못하랴?”
나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조그만 언덕길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눈 덮인 들을 바라보면서 찬 공기를 몇 번 깊이 들이마시면서 곰곰 생각했다. 아무리 외국에 팔려 온 광부 노동자이지만 독일 광부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욕설을 들어야하는 이러한 생활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무리 외국에 나가고 싶어서 이 지경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독일 광부의 욕지거리의 대상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 같았다.
공기가 흐리고 축축하고 더워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마이스터는 우리가 내려오던 공기가 아직 맑은 갱도에서 거기 놓여 있는 철 궤짝 위에 우리를 앉으라고 했다. 갱도의 벽에 기대앉으니 아침을 먹으라고 했다.
네 시 반에 아침을 먹고 왔는데 또 아침을 먹으라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통역이 아침을 집에서 먹지 않고 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는 것이 습관이니 가지고 온 빵을 하나는 지금 먹고 하나는 나중에 아홉 시 반경에 먹으라고 했다.
마이스터 에밀은 빵을 먹으면서 가지고 온 신문을 읽었다. 그는 한 반시간 후에 다 읽은 신문지와 빵을 쌌던 종이를 똘똘 뭉쳐서 아무렇게나 휙 던지고는 일어나서 우리가 앉아 있는 궤짝에 채여 있는 자물쇠를 열었다. 그 쇠로 만든 궤짝은 공구함(工具函)으로 거기에 우리가 쓸 연장이 들어 있었다. 우리를 두 명씩 나누어서 한 조(組)로 만들고, 조마다 곡괭이와 삽과 압축공기로 발동하는 굴착기인 <압바우 함머>와 공기에 연결하는 20m 긴 고무호스를 하나씩 주었다.
우리가 할 일은 갱도의 바닥을 파서 갱도의 면적을 넓히는 작업이었다. 독일의 석탄층은 카아본기(紀)에 4-5m까지 두꺼운 여러 개의 층으로서 지하에 평평하게 혹은 경사져서 깔려 있다. 채탄할 수 있는 탄층의 두께는 최소한 약 1m 되어야 했다. 한 막장을 설치할 때는 먼저 한 석탄층을 약 250m 길이의 간격으로 잘라서 양쪽 끝에 갱도를 시설하고 그 갱도 사이에 석탄층을 파내고 두 갱도를 연결한다. 이때 두 갱도 사이의 파낸 석탄층에 생기는 공간을 막장이라고 부른다. 막장은 쇠로 된 지주로 받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데 막장의 넓이는 6m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6m x 250m 면적이 하루에 3~4m 전진하는데, 이렇게 막장이 전진함에 따라 막장을 따르는 갱도가 길어진다. 막장이 끝날 때면 갱도의 길이는 거의 1000m에 달한다.
막장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정적으로 잠재하던 지압(地壓)이 동적인 압력이 되어 갱도주위를 누르기 시작한다. 갱도의 옆과 위는 철로 된 지주로 막혔지만, 바닥에는 막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갱도 바닥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통풍에도 지장이 있지만 인력과 자재(資材)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함으로 갱도를 넓혀야 한다. 그래서 갱도의 바닥을 파서 갱도를 높고 넓게 만들어야 하는 일이 우리가 오늘부터 할 일이었다.
10m 마다 한 조씩 배정하고 약 50cm 정도 깊게 파도록 했다. 바닥의 넓이는 약 4m 되었다. 나에겐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이 들었고 몸을 굽혀서 일을 하자니 허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일하는 도중에 괭이자루가 벽의 철주에 부딪치면 와그르르 하고 위에서 돌이 떨어지면서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켰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혼비백산해서 달아났다.
앉아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던 마이스터 에밀이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더러 돌아오라고 독촉하고 일을 시켰다. 에밀은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쉬거나 돌이 떨어져 달아날 때면 노상 입버릇처럼 “솨이쎄!” 라고 소리 질렀다. 통역은 “솨이쎄” 말은 똥이라는 뜻인데 상용적인 욕설로 독일에는 어느 경우든 화가 나면 “솨이쎄”라고 욕을 한다고 했다.
지하에서 처음 배운 말이 독일의 전문용 욕설인 솨이쎄였다. 솨이쎄가 똥이라는 뜻이지만, 그가 하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섞여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야! 이 똥 같은 한국 녀석들 왜 일은 않고 달아나느냐?”
“이 똥 새끼들 왜 일은 않고 또 쉬고 있느냐? 솨이쎄!”
나는 허리와 팔다리가 아픈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이놈의 나라까지 와서 욕들어먹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정말 노예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팔다리에 힘이 쑥 빠지고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쥐고 있던 압바우 함머를 놓아 버리고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함께 일하던 Z 형이 “너 왜 그래?” 하면서 걱정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 괜찮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저쪽 뒤에 앉아서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마이스터를 쳐다보았다. 채찍만 없다는 것 뿐이지, 뜨거운 햇살 아래서 목화송이를 따는 흑인 노예들을 몰아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우리가 달아나지 말라고, 우리 뒤에 앉아서 길목을 지키며 오렌지를 먹고 있는 그가 한없이 미웠다.
나는 Z 형에게 뒤로 조금 물러나라고 하고는 압바우 함머를 철주에 대고 눌렀다. 와르르 하고 돌이 몇 개 떨어지면서 먼지가 자욱하게 그가 앉아 있는 쪽으로 밀려갔다. 먼지 속에서 콜록콜록하는 기침소리와 함께 또 ‘솨이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독일인 중에서도 아주 하층에 속하는 독일 광부의 욕설을 들으며 일을 한다는 것도 원통했지만, 무덥고 먼지가 자욱한 탁한 공기를 마시며 허리를 굽히고 약 다섯 시간 일을 하고 나니, 아픈 허리도 참기 힘들었고 숨도 막히는 것만 같았다.
속으로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억누르며 독일 광산의 지하 첫날 일을 마쳤다. 우리를 태운 기차가 수갱으로 달리는 동안 덜커덕거리는 바퀴소리가 나에겐 ‘솨이쎄, 솨이쎄’ 하면서 귀속을 메아리치고 있었다.
회사 문을 나오니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눈이 내렸는지 집과 들은 한 뼘 정도 눈에 덮여 있었다. 눈길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오전에 땅속에서 하던 일을 생각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이런 천대를 받을 바에야 내 나라에 가서 내 나라 사람에게 욕을 듣고, 모욕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여기 땅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정신이면 한국에서 무슨 일을 못하랴?”
나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조그만 언덕길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눈 덮인 들을 바라보면서 찬 공기를 몇 번 깊이 들이마시면서 곰곰 생각했다. 아무리 외국에 팔려 온 광부 노동자이지만 독일 광부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욕설을 들어야하는 이러한 생활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무리 외국에 나가고 싶어서 이 지경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독일 광부의 욕지거리의 대상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 같았다.
나는 귀국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또 나에게 욕 듣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삼 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귀국할 경우에는 비행기 값을 갚아야 된다는 말이 기억났다. 비행기 값이 8000 마르크라고 했다. 미혼자로서 8000 마르크를 모으려면 거의 이 년 일을 해야 했다. 그렇다면 삼년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일은 하다보면 경력이 들어 쉬워지겠지만, 독일 녀석의 솨이쎄 모욕을 어떻게 나날이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솨이쎄” 소리가 나왔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었다. 똥! 독일의 생활은 <똥일>이었다. 기왕에 똥일을 할 바에는 바싹 들어붙어서 똥이 더럽다고 여기지 말고 똥과 한 몸이 되어서 똥을 잡는 것이었다. 튀기는 똥에 내 껍질을 내어주면서 나도 함께 똥 냄새를 풍기는 것이었다. 똥 묻은 그 껍질은 일이 끝나면 벗고 씻으면 된다. 누가 나에게 강제로 지워준 일이 아닌, 내 자신이 원해서 찾아온 독일. 이 독일 광산의 일은 시금치 밭에 하루 종일 푸던 똥처럼, 싫든 좋든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힘껏 정성껏 그 일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해결하는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솨이쎄” 소리를 입술 밖으로 내보내면서 빙그레 웃었다. 마음과 몸이 가뿐했다.
속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눈길을 달렸다.(계속)
그러나 일은 하다보면 경력이 들어 쉬워지겠지만, 독일 녀석의 솨이쎄 모욕을 어떻게 나날이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솨이쎄” 소리가 나왔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었다. 똥! 독일의 생활은 <똥일>이었다. 기왕에 똥일을 할 바에는 바싹 들어붙어서 똥이 더럽다고 여기지 말고 똥과 한 몸이 되어서 똥을 잡는 것이었다. 튀기는 똥에 내 껍질을 내어주면서 나도 함께 똥 냄새를 풍기는 것이었다. 똥 묻은 그 껍질은 일이 끝나면 벗고 씻으면 된다. 누가 나에게 강제로 지워준 일이 아닌, 내 자신이 원해서 찾아온 독일. 이 독일 광산의 일은 시금치 밭에 하루 종일 푸던 똥처럼, 싫든 좋든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힘껏 정성껏 그 일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해결하는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솨이쎄” 소리를 입술 밖으로 내보내면서 빙그레 웃었다. 마음과 몸이 가뿐했다.
속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눈길을 달렸다.(계속)
추천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